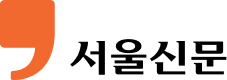수익률 낮아지고 세제혜택 줄어
올해 3년차 대기업 직장인인 차모(28·여)씨는 입사 후 가장 먼저 들었던 연금저축을 올해 초 해지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12%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 차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일반 회사원인 이상 노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연금저축부터 들었는데 도중에 혜택을 확 깎아버리니 돈을 더 부어야 할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연금저축 판매 실적은 지난해 5월 기준 44억 9100만원에서 올해 4월 9억 3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1인당 가입액은 110만원에서 23만원으로 5분의1 수준이 됐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크게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연봉 4600만~8800만원인 직장인은 지난해까지 최대 납입금 400만원에 대해 96만원(24%)의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48만원(12%)으로 줄어들었다. 김명준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수익을 더 내도 세제 혜택의 차이를 메울 수 없는 것이 부진의 이유”라고 말했다.
서민층의 목돈마련 수단으로 지난해 부활한 재형저축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보다 해지되는 계좌 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재형저축 활동계좌는 175만 2297개로 한 달 전에 비해 2만 1131개 줄었다. 7년간 묶어 둬야 하는 단점을 극복할 만큼 금리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부진의 원인이다. 4%대 고금리로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처음 3년간만 해당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는 점 역시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지난 3월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역시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임에도 10년간 돈을 묶어 놔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 상품의 부진이 가계 저축률 하락과 국민들의 노후 대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입 요건 완화와 세제 혜택 재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추가 세제혜택을 주거나 외국처럼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민간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매칭펀드 등의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6-0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