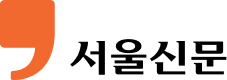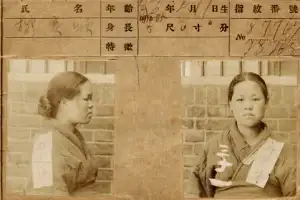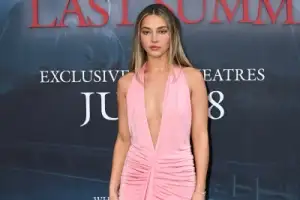한·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 행보
‘파트너십’을 강조했던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가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관심은 이제 한·미 동맹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 당장 올 하반기 외교 일정 중 코앞에 닥친 가장 큰 이벤트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정부는 ‘주도적 동북아 외교’의 성과를 잇는 ‘균형 외교’를 위한 실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원칙적으로 회담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 회담은 전통적으로 북핵 등 한반도 안보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채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 금명간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중 관계에 대한 긍정의 사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포럼’ 강연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중국 역할론’에 지지를 보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대미 외교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식지 않고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수긍적 태도가 전략적 차원이 아니냐는 측면에서다. 특히 북핵 문제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드는 미·중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가 거론되기 위해서는 이미 실무 선에서 언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적은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주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이 불거질 경우 이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긍정적 여론을 끌어냈던 한·중 신(新)밀월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9-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